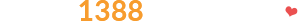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본문영역
아이가 툭하면 울더라도 다그치지 마세요
- 작성일 2017-08-07 10:57:22
- 조회 1538
- 첨부파일
진아(만 7세)는 입학해서 처음으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1학기가 다 가도록 친한 친구 하나 없는 것 같아 엄마가 일부러 만든 자리다. 그런데 놀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한 친구가 진아한테 “너 방귀 뀌었지?”라고 했다는 것이다. 놀린 것도 아니고 딱 그 한마디 했다며 그 친구도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이렇게 툭하면 울고 삐치니 친구들이 놀기 부담스러워 하지’라는 생각에 엄마는 긴 한숨이 나왔다.
진아는 여리고 섬세한 감정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것을 좀 엄밀히 따져 보면 정서가 세세하게 분화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감정을 자극하면,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각각 그 감정에 맞는 처리를 하지 못하고 모두 ‘울음’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슬퍼서 우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감기에 걸려서 아프다고, 많이 걸어서 힘들다고, 운동회 날 덥다고, 친구가 서운한 말을 했다고, 조금 부끄러웠다고 모두 울어 버리면, 친구 관계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갑자기 울어 버리면 그 주변 친구들은 졸지에 가해자가 되고 우는 아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얼떨결에 가해자가 된 친구들이 어른들에게 혼나기라도 하면, 솔직히 친구들은 그 아이와 안 놀고 싶어진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로 인해 놀이가 중단되고 아이를 달래던 친구들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그 아이를 만만하게 여기고 일부러 짓궂게 놀리기도 한다. 놀이의 흐름을 끊는 탓에 ‘기피 대상 1호’가 되어 우는 아이를 따돌리고 자기네끼리 그룹을 이루어 노는 일도 생긴다.
토라지거나 삐쳐서 말을 하지 않는 것도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그 원인은 마찬가지다.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울어 버리는 것처럼 불편함이 생길 때 토라지거나 삐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상은 다르지만 정서가 세세히 분화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불편한 상황을 울음으로 표현하는 갓난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견줄 수 있다. 갓 태어난 젖먹이가 세상과 대화하는 방법은 울음뿐이다. 아기는 밥을 달라고, 기저귀가 젖었다고, 아프다고 운다. 하지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나쁘다’ ‘좋다’ ‘싫다’ ‘아름답다’ 같은 어휘력이 늘면서 자신의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기 시작한다. 그런 점에서 툭하면 울고 삐치고 토라지는 것은 정서 언어가 잘 발달하지 못한 것이며 자기 나이에 맞지 않는 초보적인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울면 울음을 멈추게 하려는 데만 급급하다. 큰 아이가 울 때는 더욱 그렇다. “왜 울어. 그만 울어. 바보처럼 왜 울어” 하며 혼내기도 한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이유는 불편한 감정 때문인데, 감정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아이를 윽박지르고 나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의 미숙한 감정과 정서는 개선되지 않는다.
감정과 정서의 발달은 후천적이다. 때문에 어른들도 평생을 두고 질적으로 다듬어가는 것이 숙제이다. 지금 내 아이가 감성은 풍부하나 표현하는 것이 많이 미숙하다면, 잘 가르쳐줘서 발달시키면 된다. 단, 자세하고 친절하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한다.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클리닉 원장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217/3/70040100000217/20170726/85526404/1
- 이전글 "내 생각에는…"
- 다음글 폭력, 사랑의 이름으로


![[오은영의 부모마음 아이마음]아이가 툭하면 울더라도 다그치지 마세요](http://dimg.donga.com/a/180/120/95/2/wps/NEWS/IMAGE/2017/07/26/85526394.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