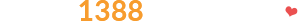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본문영역
청소년의 자존감, 비교는 폭력이다.
- 작성일 2014-03-04 19:21:54
- 조회 703
- 첨부파일
2013/08/27 02:04
![]() http://blog.naver.com/warinee23/110174928499
http://blog.naver.com/warinee23/110174928499

“요즘 청소년, 아주 문제입니다. 매일 뉴스에 보면 어휴… 하긴 길 가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가관이죠.
학교폭력이다 뭐다, 이젠 애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필자에게 직업을 물어봐서, 청소년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대번에 나오는 말들이다.
언제부터 “청소년”이라는 단어 뒤에 부정적인 서술과 사례가 붙게 된 걸까?
고대 그리스 동굴에도 새겨져 있다는 “요즘 애들 문제 많다”라는 그 세대적 차이로 넘기면 그만일까?
청소년에 사명을 갖게 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단어에서 필자는 철저히 청소년 편이 되어보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늘 던지고 싶은 질문은 “청소년 문제” 이전에 “청소년 행복”이다.
외부적인 자극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복지수를 유지하는 힘을 우리는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자존감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추리해낼 수 있다.
하나는 자존감이 낮다는 것이고, 하나는 외부적인 자극이 너무 세다는 것.
학교폭력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심리검사 결과가 비슷하다는 보고가 많다. 두 그룹 모두 자존감이 낮고, 우울증이 높다는 것.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학교폭력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현 사회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라는 것이다.
어디서부터일까? 무엇이 시작이었을까? 우리나라의 새싹이었고, 무궁무진한 꿈을 가진 청소년들의 꽁꽁 얼어버린 행복을 어떻게 해야 녹일 수 있을까?
평택복지재단에서 주최한 <좋은 부모 아카데미>를 4개월 동안 강의하면서, 많은 부모의 언어에서 빼려고 했던 것이 바로 비교언어였다.
자존감이란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그 마음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누구보다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
성적과 나의 동일시, 외모에 대한 평가 등이 먼저 주입되면 자존감이 자리잡기 힘들다.
하다못해, 꿈마저도 경쟁이 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청소년들은 자존감에 의한 절대성의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비교는 폭력이다. 인간이라는 존엄한 존재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고, 존재감이 중요한 인간에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은 어른들의 이러한 비교폭력에서 나온 아이들의 외침이다.
그런데 또 우리는 이것을 “문제”라는 손쉬운 틀에 가두고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부모와 교사 그리고 어른들이 어떤 말을 아이들에게 해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소통에서 어떤 것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한 플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고민인데,
반대로 마이너스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싶다.
내가 하고 있는 언어와 비언어 중에서 무엇을 빼면 좋을지, 무엇을 빼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정을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 애정이 그대로 전달될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자존감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자존감이 무엇이다. 라고 해석하기엔 위험요소도 참 많고, 복잡하기도 하다. 하지만 아주 단순하기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 이 의미는 "무엇 때문에" 가치 있고 존중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많이 "무엇 때문에"를 만들기 위해 달려가고 있지는 않을까?
무엇 때문에 존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되는 차원. 이 차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태어나면 그 자체로 부여되는 것일 것이다.
심지어, 착하니까, 선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가치 있다도 아닌 그냥 그 자체. 다른 사람보다 더 갖고 덜 갖고가 존재의 크기를 좌우하고 있다면 이미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나에 대한, 당신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
가끔 서운하기도 하고, 문득 속상하기도 할 테지만 그것 때문에 근본적인 마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그래서 누군가의 말에 꿈이 바뀌거나, 미래에 대한 인식이 바뀌거나 하지 않는 것 말이다.
청소년의 자존감 그리고 자존감에서 솟는 행복, 그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온 우리 어른들의 가장 큰 과제로 떠안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