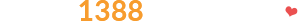청소년의 뒤를 따라 미래로 향하는 성장의 길을 걷습니다.
본문영역
스티븐 잡스가 자식에게 물려 준 가치
- 작성일 2014-11-14 17:44:04
- 조회 752
- 첨부파일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에메의 단편소설 생존시간카드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은 가상의 사회에서 얘기를 시작한다. 가난한 이들은 돈이 부족해 부자에게 자기 시간을 판다. 부자의 한 달은 31일이 아닌 36일, 40일로 계속 늘어난다. 가난한 이들은 영원히 시간에 예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소설가 김영하는 최근 출시한 산문집 보다에서 마르셀 에메의 이 소설을 인용해 스티브 잡스를 시간도둑의 주범으로 몬다. 비싼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데 추가로 돈(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내면서도 고개를 처박고 이용시간까지도 함께 바치고 마는, 폰 노예가 되고 있는 현대인들을 비꼰 것이다.
김영하씨의 얘기는 주체로서 개인이 개별 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소비하는지를 묻는다는 점에서 생각해볼 만하다. 경제력이 없는 대학생이 고급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용돈을 아껴 모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 폰에 얽매인다면 얘기는 다르다. "폰 때문에 다른 일을 못했어"라는 탄식을 쏟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실제 폰과 시간의 노예가 된 모습은 주변에 널렸다.
우리는 왜 멍청한 소비자가 되는 것일까. 스마트폰만 놓고 보면 비싸다라는 가격에만 얽매이지 폰이 자기 삶에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사용되는지를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회자됐지만 지난 9월10일자 뉴욕타임스 보도는 화젯거리였다. 잡스가 생전에 자식에게 컴퓨터를 포함해 IT기기 사용을 통제했다는 보도내용이었다(실은 실리콘밸리 유명 CEO 대부분 그렇다). 여기에는 아이패드도 포함됐다. 잡스가 인문학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아이들과 역사에 대해 논하기를 즐겼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아버지 잡스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가치를 자식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 잡스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없는 지금, 아버지가 만든 그 위대한 물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며 사용하고 있을까.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서정가제를 앞두고도 논란이 심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이 책을 사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이미 언론들은 개정 도서정가제 → 책값 인상을 기정사실로 적는다. 새 제도는 신간이든 구간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책 할인을 15% 이내로 금했다. 현재는 18개월이 안된 책은 19% 이내에서, 18개월 넘은 책은 자유롭게 할인판매를 허용하니 결과적으로 책값 인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어떤 책이 어떤 가격에 판매될지 알 수 없음에도 세일품목이 줄어든다는 이유를 앞세워 책이 비싸지고 결국 소비자가 불편해진다고 떠드는 게 우선일까. 안 읽히는 책은 폭탄세일을 해도 안 팔린다는 게 출판계의 공식인데, 책의 가치는 여전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싸다 비싸다 논쟁만 앞세우니 말이다.
딸아이가 폰으로 자기가 읽은 책을 찍어둔 사진을 보내왔다. 학교 도서관에서 빌려 다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갖고 싶다는 거다. 당연히 사주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한다. 아이는 다 읽은 책이니 엄마가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단다. 그 책은 내 기준으로 훌륭한 고전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지금 느끼는 그 책의 소장가치가 낮다고 폄훼하는 게 옳을까.
스마트폰이나 책의 가격이 싸진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더 잘 활용하고 책을 더 많이 읽을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사회, 있어도 늘 부족한 게 돈이라던가. 그렇다고 해서 내 손에 쥔 상품이 내게 주는 가치를 따지지 못하는 무능까지 사회 탓으로 돌릴 순 없는 노릇이다.
신혜선 정보미디어과학부/문화부 부장